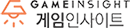비디오게임 태동기와 함께 걸었다. 암흑기는 길었다. 하지만 터널의 끝이 보인다.
대전격투는 원초적이면서도 매력 있는 장르였다. 나 자신과 상대방, 오직 서로를 보고 맞붙는 승부다. 싸움을 펼친 끝에 체력을 모두 소모한 측이 패배한다. 규칙은 간단하지만 실력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1992년 스트리트파이터2를 기점으로 르네상스가 열렸다. 서로 주먹을 치켜든 두 캐릭터와 상단 체력바는 각종 방송에서 패러디로 쓰일 만큼 게임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아랑전설과 사무라이 쇼다운, 킹오브파이터즈를 건너 버추어파이터, 철권, 소울칼리버, DOA 등 3D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IP가 대전격투를 수놓았다.

전성기는 계속되지 않았다. 대전격투가 침체기에 빠진 것은 아케이드의 황혼과 맞물린다. 오락실 문화가 사장되자 승부를 겨루면서 떠들 상대가 사라졌다. 인터넷 보급과 온라인게임 발달은 더욱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을 유행시켰다.
상대적으로 높은 진입장벽은 '고인물'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콘텐츠는 다른 유저와 대결뿐인데, 신규 유저가 숙련자를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했다. 싱글 연습모드에서 유저에 버금가는 인공지능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게임 환경이 바뀌면서 조작 역시 장벽이 됐다. 키보드나 게임패드는 온전히 커맨드를 입력하기 어렵다. 게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오직 대전격투에서만 쓰이는 조이스틱을 비싸게 구매할 유저는 극히 드물다.
기술마다 특수한 커맨드를 외워야 하고, 커맨드를 조합해 콤보로 연결하는 기술까지 익혀야 한다. 게임에 따라서는 블로킹과 낙법, 캔슬 개념까지 소화가 필요하다. 갈수록 조작을 간편화하는 게임 트렌드에서 대전격투는 역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격투는 완전히 도태되지 않았다. 오히려 뉴미디어를 기반에 깔고 새로운 콘텐츠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서구권 시장은 닌텐도의 슈퍼스매시브라더스(대난투) 시리즈가 장르를 떠받쳐왔다.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된 슈퍼스매시브라더스 얼티밋은 출시 1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판매량 1천만장을 넘겼고, 2020년까지 전세계 2,300만장 가량 판매됐다.
다른 대전격투와 달리 대난투 시리즈가 미국 국민게임으로 자리잡은 이유는 2종류로 압축된다. 쉽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다. 누가 어떤 캐릭터를 사용하든 복잡한 커맨드 조작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장외패 같은 독창적인 규칙으로 인해 초심자가 유쾌한 역전승을 따내기도 한다. 일대일 격투뿐 아니라 미니게임 같은 모드도 즐길 수 있다.
한편 마스터는 어려운 게임이다. 액션이 자유로운 만큼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캔슬을 활용한 기동전 역시 파고들 경우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대난투는 라이트유저의 파티게임, 헤비유저의 테크닉 싸움을 동시에 아우르는 시리즈가 됐다.

대난투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암흑기가 지속되던 대전격투계도 조금씩 변화해나갔다. IP와 캐릭터의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타 장르 IP의 대전격투 개발이 활발해졌다. 진입장벽을 시스템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도 뒤따랐다.
아크시스템웍스는 대표적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개발사다. 간판 시리즈인 길티기어는 '고인물 끝판왕'이라는 별칭이 있었다. 그만큼 장르 숙련도가 절대적이었다. 로망캔슬 등의 고유 시스템은 활용법 이전에 개념 이해조차 어려웠다. 초심자는 자신이 무엇에 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손을 놓고 당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6월 출시를 앞둔 길티기어 스트라이브는 클로즈베타에서 놀라움을 선사했다. 첫째로 카툰 렌더링의 극한을 끌어낸 그래픽, 둘째로 전에 없던 접근성 덕분이었다. 레이팅을 층으로 구별해 최대한 초심자를 보호했고, 상대하기 까다로운 종류의 기술은 과감하게 삭제했다.
타 게임사 IP와의 협업도 활발해졌다. 높은 퀄리티로 캐릭터성을 살린 연출이 주효했다. 특히 드래곤볼 파이터즈는 비주얼과 접근성을 모두 잡은 흥행사례다. 이후 사이게임즈와 협업해 그랑블루 판타지 버서스를 선보였고, 현재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IP를 활용한 DNF 듀얼을 개발하고 있다.

대전격투 장르는 비관적 전망을 딛고 출시 빈도를 늘려나간다. 아케이드와 콘솔에 집착하던 과거와 달리 PC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키보드 조작 개선도 꾸준히 이뤄졌다.
'보는 게임'으로 재평가되면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대전격투는 플레이 진입장벽이 높지만 관전자는 반대로 지극히 직관적이다. 규칙이 무엇인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누가 잘하는지, 방금 어떤 슈퍼플레이가 나왔는지 등 주요 정보를 사전지식 없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 최대 대전격투 대회인 EVO를 소니가 거액에 인수한 것도 가능성에 의한 선택이다. 장르를 향한 비관적 전망과 달리 e스포츠 규모는 매년 커졌다. 대전격투 관련 행사와 인플루언서 규모 역시 국내외에서 급성장했다.
대전격투가 다시 '유행' 장르로 거듭날 수 있을까. 분명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즐기기는 힘든 장르다. 대신, 미디어의 재료로 부담 없이 쓰일 수는 있다. 대전격투는 악조건 속에서 조금씩 변화해나갔다.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